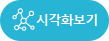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2900479 |
|---|---|
| 한자 | 盤雲里古墳群 |
| 영어의미역 | Ancient Tombs in Banun-ri |
| 이칭/별칭 | 반운리고분군의 ①돌덧널무덤군과 ②덧널무덤군 |
| 분야 | 역사/전통 시대,문화유산/유형 유산 |
| 유형 | 유적/고분 |
| 지역 |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산 36 |
| 시대 | 고대/초기 국가 시대/삼한,고대/삼국 시대/가야,고대/삼국 시대/신라 |
| 집필자 | 조영현 |
| 성격 | 고분 |
|---|---|
| 양식 | 수혈식 석곽묘[구덩식 돌덧널무덤]|목곽묘[덧널무덤] |
| 건립시기/연도 | 6세기[반운리 고분군(1)]|2~4세기[반운리 고분군(2)] |
| 소재지 주소 |
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산 36
|
[정의]
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에 있는 삼한시대와 대가야시대의 고분군.
[위치]
반운리 고분군①은 대가야읍 중심부로부터 동남동으로 직선거리로 4.3㎞ 떨어져 있는 반운리 웃담마을의 남서쪽 야산에 위치한다. 그곳은 고령읍내 동쪽 맞은편에 우뚝하게 솟은 금산에서 동남쪽 회천의 단애면을 따라 길게 뻗어 내리는 야산 줄기의 끝부분에 해당한다. 반운리 고분군②는 고분군에서 서북쪽으로 약 1㎞ 떨어져 육도처럼 돌출된 야산의 서북쪽 산등성이와 비탈면에 분포한다.
[발굴조사경위 및 결과]
반운리 고분군①에서는 발굴 조사된 고분이 없다. 반운리 고분군②에서는 채집된 2~4세기의 와질 토기가 보고되어 있고, 또 개진면 반운리 18번지 납골묘 조성 부지 안에서 소형 묘 3기가 동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되어 형태와 출토 유물의 내용이 밝혀졌다.
[형태]
반운리 고분군①에서는 파괴된 고분의 석재로 보이는 할석들과 각종 회청색 경질토기(硬質土器) 조각이 드문드문 드러나 있다. 정상부에는 돌덧널의 장벽으로 보이는 석축열이 드러나 있는데, 그 상태로 보아 소형 구덩식 돌덧널로 판단된다. 고분군은 분포 밀도가 높지 않은 소규모 구덩식 돌덧널무덤군으로 추정된다. 반운리 고분군②에서 발굴조사 된 3기는 모두 장축이 등고선과 평행하는 3세기 무렵의 덧널무덤으로 2기는 소형이고 1기는 중형급에 해당한다.
[출토유물]
반운리 고분군① 일대에 흩어져 있는 토기 조각은 항아리의 아가리나 몸체, 대옹(大甕) 등 회청색 경질의 작은 파편이다. 이것으로 정확한 기본 형태나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, 대체로 대가야시대와 신라에 병합된 직후의 것으로 추정된다. 반운리 고분군②에서 수습된 지표 유물은 우각형 파수부 긴목항아리, 노형 그릇받침, 양이부호(兩耳附壺), 짧은목항아리, 대호(大壺) 조각 등이다. 발굴 조사된 덧널무덤 내부와 주위에서 수습된 유물은 작은 짧은목항아리, 삿무늬 짧은목항아리, 방추, 단조·주조철부, 굽은 소도, 철창 등이다.
[현황]
현재 반운리 고분군이 위치한 산 일대 전체가 숲이 무성하게 조성되어 있어 현장을 답사하여도 고분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. 다만 발굴 조사된 덧널무덤 3기의 위치는 납골묘역으로 조성되어 잔디가 심어져 있다.
[의의와 평가]
반운리 고분군은 회천변 충적지와 신안천변의 작은 곡저 평지를 기반으로 살았던 삼한시대와 대가야시대 및 그 직후의 주민들이 묻힌 고분군으로 추정된다. 삼한시대의 고분군이 조성되었고, 2세기를 지난 뒤 그 인접지에 다시 조성된 대가야의 소규모 단위 고분군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.
- 『문화유적분포지도』 -고령군(계명대학교 박물관, 1998)
- 홍진근, 「고령 반운리 와질토기 유적」(『영남고고학』10, 영남고고학회, 1992)
- 김현정, 『고령 반운리 유적』(동양대학교 박물관, 2005)